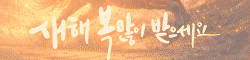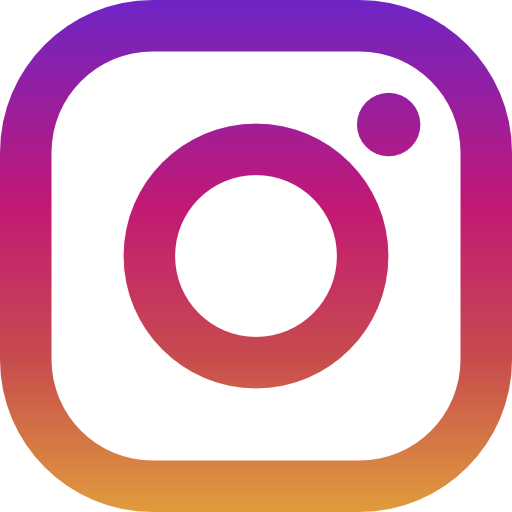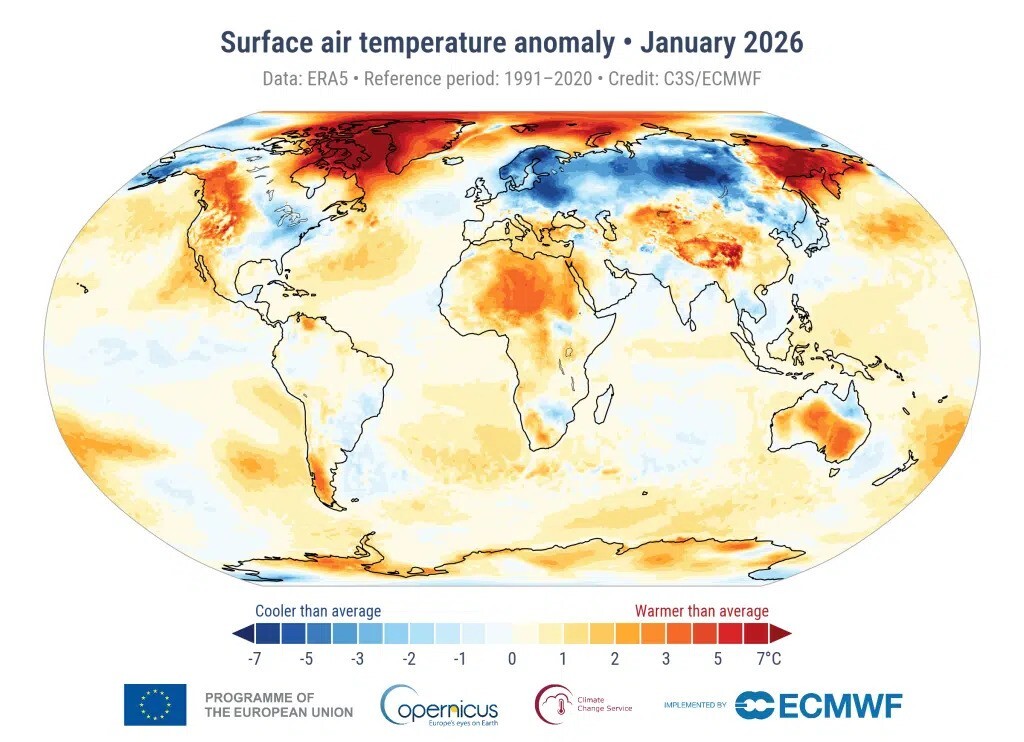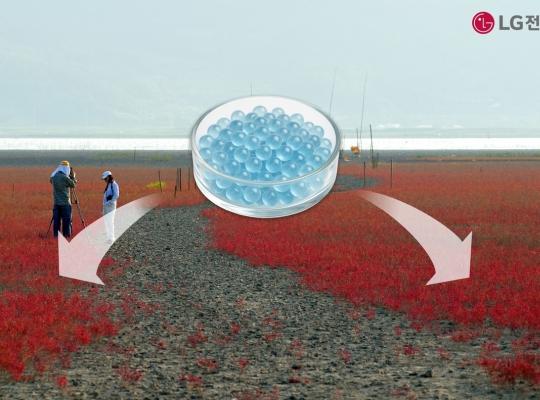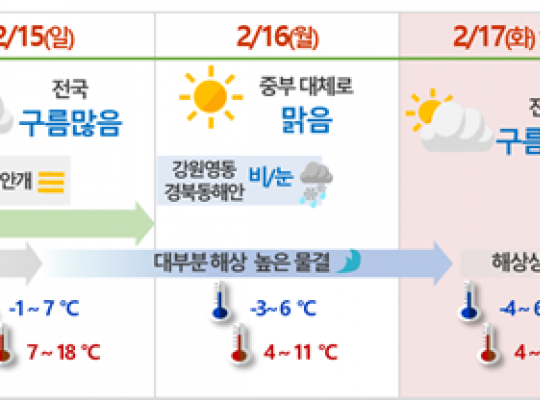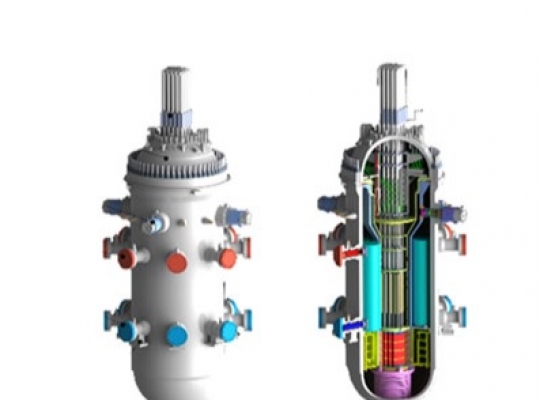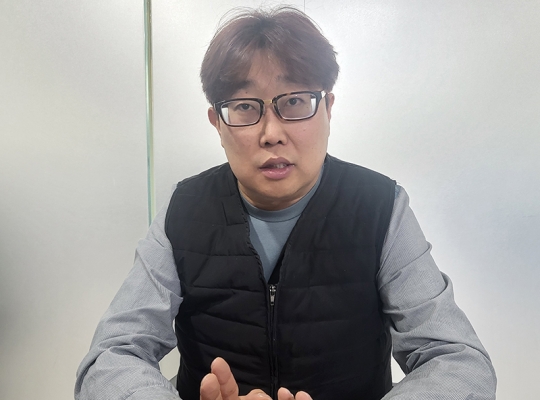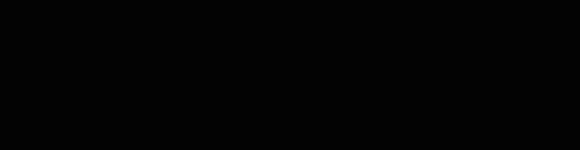아시아 13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녹색금융 평가에서 한국이 8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1위를 차지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은 글로벌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Positivemoney)가 지난 9월 발표한 '녹색 중앙은행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녹색금융 수준이 아시아·태평양 13개국 가운데 8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이 평가에서 130점 만점에 24점을 획득한데 비해, 중국은 50점을 받아 1위를 기록했다. 심지어 태국도 25점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이번 평가는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녹색금융 관련 정책을 △통화정책 △금융정책 △선도적 모범 △연구·정책권고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통화정책 부문에서 50점 만점에 13점을 받았고, 금융정책(3점), 선도적 모범(3점), 연구·정책권고(5점)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은 경제규모와 제도적 역량에 비해 기대이하의 성과"라며 정책 이행력 부족을 가장 큰 약점으로 꼽았다.
중국은 금융정책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국인민은행(PBC)이 실시한 '기후스트레스 테스트'와 은행·보험사에 환경요소를 경영에 통합하도록 의무화한 녹색금융 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이다. 또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는 탄소감축기금과 녹색채권의 담보체계 편입 등 통화정책에서도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보고서는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녹색 중앙은행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석탄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여전히 개선과제로 지적했다.
일본은 통화정책 부문에서 중국과 공동1위를 차지했다. 일본은행(BOJ)은 2024년부터 정부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전략에 따라 '일본 기후전환채(Japan Climate Transition Bonds)'를 공개시장운영(OMO)과 담보체계에 포함했다. JCTB는 고탄소 산업의 탈탄소화 가능성에 투자하는 전환형 채권으로, 이미 친환경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는 녹색채권(green bond)과 구분된다. 보고서는 이를 뛰어난 통화정책 사례로 꼽았지만, 가능성 중심 투자라는 특성상 '그린워싱' 우려도 함께 지적했다.
한국은 통화정책 부문에서 그나마 중국과 일본보다 3점 낮은 13점을 기록했다. 2023년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중 196억달러(약 27조원)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자산으로 편입했고, 석탄 및 화석연료 관련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지역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 중소기업 대출을 포함한 은행에 우대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우대금리가 녹색대출 실적과 직접 연계되지 않고, 명확한 녹색 정의가 부재하다"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금융위원회(FSC)의 '기후리스크 관리지침'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녹색대출 차등자본요건, 기후요인의 감독 프로세스 반영, 금융기관의 탄소중립 목표 공시 의무화 등 핵심 규제정책이 여전히 부재하다고 지적됐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 녹색국채의 부재가 한국은행의 녹색증권 정책을 가로막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2021년 녹색채권을 공개시장운영(OMO)과 담보체계에 편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의 녹색국채가 발행되지 않아 실행되지 못했다. 또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이 2026년 이후로 연기된 점도 정책 추진력 저하의 원인으로 꼽혔다.
포지티브머니는 "한국은행과 정부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며 "녹색증권을 통화정책의 핵심 운영체계에 통합하고, 기후위기와 관련한 감독·자본규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규근 의원은 "기후위기는 금융시장 전체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주도권을 쥐고 대응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지티브머니의 보고서는 "The East and Southeast Asia Green Central Banking Scorecard"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