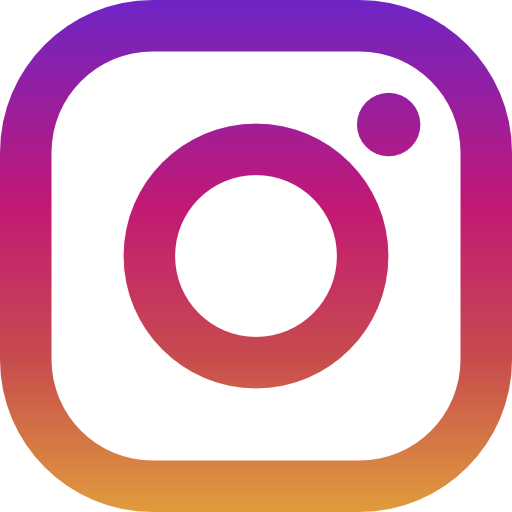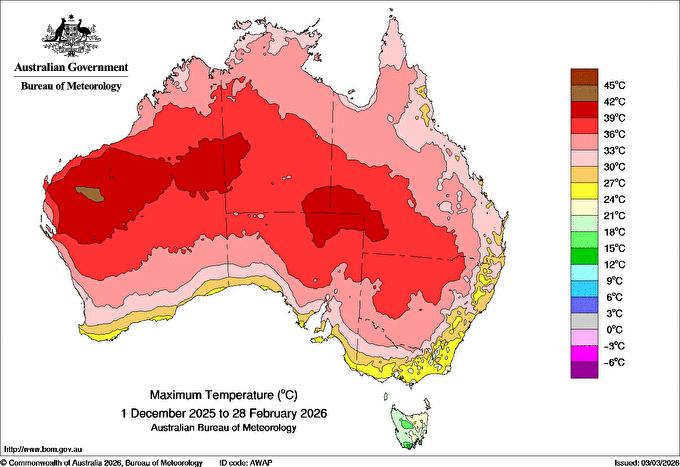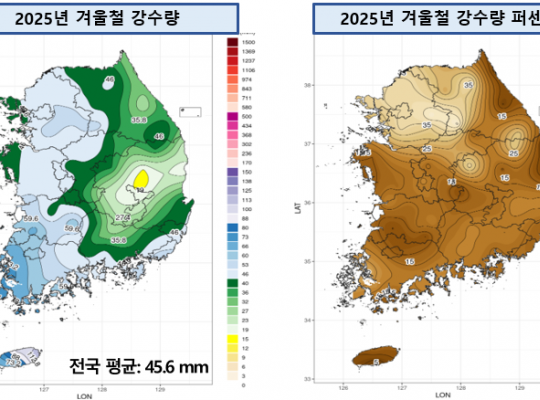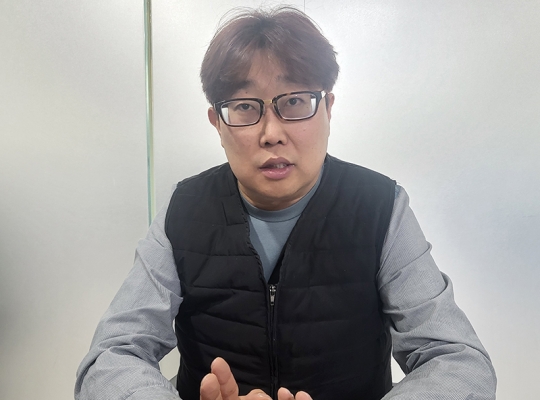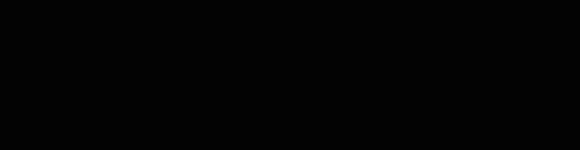서울시가 대형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도가 낮아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속을 끓이고 있다.
서울시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지난 2024년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참여하는 건물은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A부터 E까지 등급이 부여한다. 사용량이 매년 달라지는 만큼 신고도 매년 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과 3000㎡ 이상 비주거용 민간건물이다. 이에 해당하는 건물은 서울시에 약 1만5125곳이 있다. 서울시 전체 건물 58만동 가운데 약 2.4% 비중이다. '에너지 신고·등급제'에 해당되는 건물의 비율은 낮지만 이 건물들이 전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는 이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실시한 것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참여한 건물은 지난해말 기준 6400개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올해 대상의 절반 수준인 770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표준화된 온라인 시스템이 없고 신고 절차가 복잡한 데다 참여를 끌어낼 만한 실질적 유인책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신고 과정이 너무 번거롭다.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려면 계량기별로 데이터를 입력해야 한다. 그런데 대형 건물들은 층별, 사무실별, 입주업체별로 계량기가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다. 계량기마다 부여된 고객번호를 모두 파악해서 데이터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것이다. 계량기 정보를 한번에 모아볼 수 있는 표준화된 전산시스템도 없고, 데이터 입력도 자동화되지 않아 사람이 일일이 숫자를 옮겨 적다보니 오류나 누락이 빈번하다. 서울시는 가능한 범위에서 건물 전체의 전력 사용량을 파악해 에너지 신고 과정을 자동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느 수준까지 연동이 가능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신고 과정이 번거로운데 비해 얻을 실익도 거의 없다. 에너지 등급이 C~E로 낮은 건물은 컨설팅이나 저리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에너지 등급이 높은 건물은 아무런 보상이 없다. 전기요금 인하처럼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지방정부 권한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참여를 유도할 마땅한 카드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 제도는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강제성이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그 전까지는 자발적 참여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법적 의무화가 이뤄지기 전에 시민과 건물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관리하기 위한 분류기준이 12개에 불과하다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건물의 실제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물은 같은 면적이라도 사용 목적과 시설 구성에 따라 에너지 사용 패턴이 크게 다르다. 이같은 지적에 서울시는 분류기준을 60개 이상으로 늘려, 건물 용도와 이용 특성에 맞춘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 특성상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전체의 68~7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대형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22%에 달하는만큼 시의 입장에서는 대형 건물의 탄소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핵심축인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에너지 신고·등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서울시 친환경건물과 관계자는 "아직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건물주가 많아 안내만으로도 개선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동화 및 지원책에는 지자체 입장에서 별다른 수를 내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향후 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 자동화 작업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는 바람을 드러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